 | 어떻게 죽음을 마주할 것인가 -  모니카 렌츠 지음, 전진만 옮김/책세상 |
 | 아름답게 떠날 권리 -  김종운 지음/유리창 |
날 때 나는 울었지만 주변사람들은 웃었다. 이제 내가 죽을 때 주변사람들은 울지만 나는 웃는다.”(121쪽) 인디언 격언이다.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초연한 품격이 보인다. 이 책이 주장하고 지향하는 죽음의 모습이다. ‘지금 당장 나와 가족의 인간답고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43개국 중 118위이고, ‘죽음의 질’은 주요 40개국 중 32위이다. 사망자의 70%가 병원에서 사망하고, 병원 사망자의 80% 이상이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거나 의식 없이 사망한다. 현대의학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를 박탈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공표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기간만 늘리는 연명의료의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두렵다고 피할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죽음을 맞을 것인가. 이 책은 ‘영혼’에 주목한다. 영혼의 근육을 키우면 인간답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영혼을 연마하는 것이고, 철학함으로써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책의 생각도 같다.
한의학적 생명관에 따르면 우리 생명은 몸?마음?영혼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이 있기 전에 영혼이 있었고 죽음에 이르러 몸과 마음 즉 육신이 빠져나가고 다시 영혼이 남는다는 것. 영혼에 기氣가 흐르면서 생명이 되고 생명에 기가 빠지면서 영혼만 남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생명이 있기 전에도 생명이 그 기운을 다한 뒤에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생명의 구성요소인, 죽음 이후에도 ‘나’로 남아있을 ‘영혼’에 주목하고 있다. 영혼을 연마하면 ‘죽음’이 단지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소크라테스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이 곧 영혼 연마이며 이는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독배를 받았다는 일화는 그래서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인지하기 어렵다. 저자는 지성과 감각을 개발하고, 명상을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통해 영혼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상에서 느낌에 충실하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재미’를 추구하며 미소를 잃지 않으면 우리 생명의 가장 고차원인 영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영혼을 인지하면 죽음은 영혼-생명(몸?마음?영혼)-영혼의 ‘나’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죽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미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만다. 농부가 이른 봄에 밭을 갈면서 가을 추수를 대비하고 농사를 준비하듯이, 죽음이 아직 멀게 느껴지는 때에 미리 죽음을 바라보는 내적 변화를 이루어야한다. 하다못해 소풍을 가더라도 도시락을 준비하고 준비물을 챙기는 법인데 언젠가는 가야하는 다시 못 올 길을 떠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어쩌겠는가. -280쪽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 죽음이란 무엇인가 -  셸리 케이건 지음, 박세연 옮김/엘도라도 |
이제 케이건 교수는 유한한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 다시 말해 행복의 본질에 관한 주제로 논의를 전환한다. 무엇이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가? 삶에서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것은 무엇인가? 그는 우선 이와 관련한 대표적 철학 이론인 ‘쾌락주의(hedonism)’의 입장을 소개한 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의 사고 실험인 ‘경험 기계(experience machine)’를 예로 들어 ‘쾌락(快樂)’이 본질적인 행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삶의 가치는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 속에 채워지는 ‘내용물(contents)’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면서 삶은 ‘그릇(container)’이며 그 속에 채워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총합을 통해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릇 이론(container theory)’에 관해 살핀다.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의 ‘필연성(必然性, inevitability)’,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죽음의 ‘가변성(可變性, variability)’,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예측불가능성(豫測不可能性, unpredictability)’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편재성(遍在性, ubiquity)’을 설명한다.
케이건 교수는 이러한 죽음의 특성을 이해할 때, 유한한 삶을 인정하지 않고 죽는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적절한 태도인지 묻는다. 또한 “죽음은 반드시 삶이 끝난 다음, 즉 삶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삶 자체나 죽음 자체가 아니라,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역설한다. 아울러 삶과 죽음은 긍정적·부정적 상호효과를 모두 갖고 있으며 우리가 부정적 상호효과만을 받아들일 때 삶은 나쁜 것이 돼버린다고 지적한다.
 |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  오츠 슈이치 지음, 황소연 옮김/21세기북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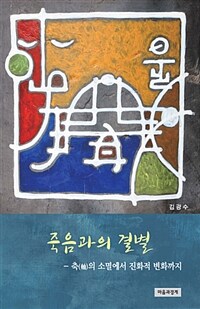 | 죽음과의 결별 -  김광수 지음/마음과경계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