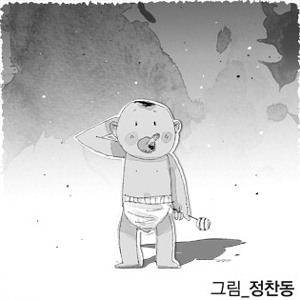 2017년 합계출산율 1.05. 신생아 숫자 35만7700명. 충격적 수치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이론상 합계출산율이 2.1이 돼야 하는데, 딱 절반 수준이다. 이들의 조부모 세대인 1958년생이 99만3600명, 부모 세대인 1987년생이 61만6400명이니까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30만명 정도 줄어든 셈이다.
2017년 합계출산율 1.05. 신생아 숫자 35만7700명. 충격적 수치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이론상 합계출산율이 2.1이 돼야 하는데, 딱 절반 수준이다. 이들의 조부모 세대인 1958년생이 99만3600명, 부모 세대인 1987년생이 61만6400명이니까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30만명 정도 줄어든 셈이다.'어쩌라고?' 출산율 뉴스를 접한 아들딸 반응이다. '이 몸으로 아이를 낳든 말든 국가나 사회나 심지어 부모라도 도대체 뭔 상관!' 청년층은 행복에 절박하다. 사랑과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적 영토를 공적 명분을 빌미로 식민화하려는 발상은 이제 의미 없다. 개인 자유와 존엄의 실현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청년층의 당연한 감수성을 생각하면 헛발질일 뿐이다.
따져보면, 우습다. 아이가 도구도 아닌데, 국가의 발전, 사회의 존속, 집안의 미래를 생각하라니. 사르트르의 말처럼, 인간은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세상에 던져지고, 주어진 자유를 활용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실현해 간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태어나는 생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생각의 파시즘'을 넘지 못하는 한, 저출산이 가져올 '고요한 재난'에 대처하는 것은 힘들다. 저출산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출산율 저하는 한 세대 이상 누적된 사회 변동이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다. 그 중심에는 고양된 자아실현 욕구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제도 사이의 모순이 있다. 청년 실업, 주거 불안, 사교육비 부담 등은 원인의 표층에 불과하다. 고학력 고소득 비혼(非婚)이나 맞벌이 무자녀 부부의 증가야말로 저출산의 진짜 무의식이다.
사랑을 하는 것보다 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누가 사랑을 하겠는가. 연애만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불행하다면 누가 결혼을 하겠는가. 아이가 있는 삶이 아이가 없는 삶보다 힘들고 괴롭다면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아이의 존재가 삶의 질을 끌어내리는 사회,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자아실현을 훼방하는 사회에서 저출산 해결은 불가능하다.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려면 사회적 논란을 가져올 정도로 과감하고 충격적 정책이 필요하다.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고, 생후 세 달 이상 아이들 전체를 보육하는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다자녀 가정에 양육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프랑스에서 이미 효과가 있었고, 일본이 현재 만지작대는 정책이다. 사회적 육아를 이 수준까지 도입해 청년들을 감동시켜야 비로소 저출산의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어 보인다. 당국의 비상한 상상력을 촉구한다.
저출산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아실현 욕구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제도 사이의 모순"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양육 생활비 지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등 "사회적 육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칼럼을 어떻게 보셨나요? 칼럼 전문 또는 부분을 오늘 자정까지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1. 칼럼은 "저출산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필자의 이런 의견을 어떻게 보시나요?
2. 저출산 위기 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의견을 톡게시판 댓글로 써주시면 생각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글의 구조
[1]출산이 충격적으로 줄었다. - 데이터제시
[2]-[3] 자유가 중요해짐 - 개인의 가치관변화
[4]-[6] 출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현실 - 한국사회의 모순
[7]과감하고 충격적인 정책이 필요함 - 제언
■ 감상
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출산율 저하의 내밀한 이유로 지적한 저자의 생각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이것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심리를 풀어서 서술했다면 공감이 더 잘되었을 것 같다.
이번 주에 읽은 <이상한 정상가족>에 소개된 스웨덴 가족정책이 생각난다. 스웨덴은 국가가 가족에게 안전한 경제적기반과 아이를 자발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부모 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족의 경우 사회가 출산과 양육을 돕고 아이의 미래를 함께 돌본다'는 것을 정책의 핵심으로 본다고 한다.자발적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교육,의료,주택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pp.225>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여전히 주어가 국가와 사회이다.
이제는 부모될 사람을 '주어'로 어떻게 하면 낳고 싶을지를 생각해보는게 필요할 것 같다.
댓글